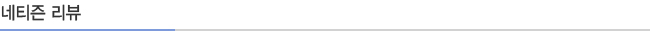|
영화가 시작되면 카메라는 한 핑크빛 옷을 입은 한 아이를 조심스레 쫓아간다. 딱봐도 예쁠것같은 그 아이를 한동안 쫓아가다 화면의 한 귀퉁이에 어떤 평범한 아이가 인라인을 타다 넘어진다. 그제서야 카메라는 그 넘어진 아이에게 시선을 돌리고 타이틀이 뜬다. '열세살 수아' 이렇듯 이 영화는 어떤 특별한 아이의 특별한 이야기를 그리려 하지 않고 길다가 한번쯤은 부딪혀봤을법한, 스케이트 타다 넘어지는 이 아이의 소리없는 아우성과도 같은 성장통을 그리고 있다. 영화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여느 평범한 13살 소녀의 일상과 강렬했던 성장통을 그리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진짜엄마'를 찾아 떠나는 그녀의 여정은 어쩌면 처음부터 실패하기로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극중의 대사처럼 우울해 보이고 고물상 아저씨가 괜히 싫은 그녀는 여타의 과정을 통해 그 싫던 고물상 아저씨앞에서 웃을수 있게되고 그제서야 아빠에게 작별의 인사를 한다.
생각해보면 나의 13살은 어땠지? 그놈의 13살이 문제다. 초딩에서 중딩으로 넘어가는 시기. (초딩과 중딩은 어감부터가 완전히 다르다) 소위 '대가리'라는게 커지기 시작하고 '집구석'이 지긋지긋해지며 가족보다 친구를 우선시하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질풍노도의 시기의 절정을 달리기 시작한다. 나역시 영화속 수아와 비슷한 맥락에서 막내삼촌이 우리 아빠였으면 하고 바랐던 적도 있고 슬슬 부모님에게 반항하기 시작한것도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였다. 어쩌면 초등학생인 나와 중학생인 나는 전혀 다른 DNA를 가진 다른 인종일지도 모른다는 오바스러운 추측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13살 이후에 일어났다. 영화는 이런 13살에 막 접어든 한 소녀의 성장통을 폭발적이거나 소란스럽게 그리지 않고 차분하고 담담하게, 하지만 매우 인상적으로 잘 그려냈다. 영화의 기획을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와 <내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을 만든 민규동 감독이라는걸 밝히면 영화의 느낌이 좀더 명확해 지려나? 사실 영화를 보면 나같이 '사내아이의 13살'을 보냈던 남자들에겐 조금 이해하지 어려운 감성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가 <해변의 카프카>에서도 보여줬듯이 13살이라는 나이는 어떠한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매우 흥미롭고도 매력적인 소재이기에 굳이 여성영화라는 타이틀은 붙이고 싶지 않다.
영화의 음악 역시 매우 인상적인데 당연히 김윤아가 맡지 않았을까 했지만 크레딧에서 확인해보니 자우림의 멤버인 이선규와 김진만이 맡았다. 사실 이 영화는 촬영 소식이 들려와도, 김윤아가 나온다고 해도 나에게 큰 흥미를 일으키지 못했던 작품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완소 제작, 배급사가 되버린 스폰지의 이름값과 유수언론들의 호평과 이세영의 열연에 힘입어 나를 극장으로 불러들이게 된 것이다. 그전의 필모그래피에서 거의 깍쟁이 서울학생 이미지의 케릭터를 자주 맡곤 했던 이세영이 이리도 '못생겨'보일수 있다는건 그녀의 배우로서의 미래가 매우 밝고 기대된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만히 누워있다가도 괜시리 눈물이 흘렀던 날이 있더랬다. 혹시 나에게 저사람들이 아닌 진짜 부모가 있는건 아닐까 생각한 날이 있더랬다. 어느날 문득 '집구석'이 너무나 지긋지긋해져 하루종일 가출생각만 한적이 있더랬다. 당신의 13살은 안녕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