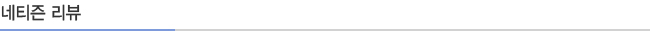|
12세기 초, 프랑스와의 전쟁에 한창인 영국을 위해 참전한 로빈 롱스트라이드는 빼어난 활 솜씨로 전쟁에서 큰 활약을 펼치지만 리처드 왕이 전투 중 사망하자 전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그때 왕관을 나르던 영국 군인들이 매복으로 기습을 당하자 그들을 도와주고 그 무리에 있던 로빈 록슬리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께 검을 돌려 드리기 위해 런던으로 향합니다. 때마침 리처드에 이어 동생인 존이 왕위에 오르고 형과 다르게 무거운 세금으로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자 귀족을 중심으로 왕위에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검만 돌려주려다 로빈 록슬리 행세까지 하게 된 로빈도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며 왕의 폭정을 막기 위해 무리에 합류하지만 그보다 먼저 혼란한 영국을 노리고 침략하는 프랑스 대군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흥행과 작품성 모두를 갖춘 작품을 만드는 몇 안되는 감독 중에 한명인 리들리 스콧 감독은 특정한 장르를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리들리 스콧 감독하면 바로 떠오를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영화가 없었습니다. 그마나 <델마와 루이스> 정도랄까요. 하지만 러셀 크로우 주연의 <글라디에이터>를 기점으로 그런 인식에는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강렬함 오프닝과 검투사들의 생명을 건 전투 장면은 손에 땀을 쥐게 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러셀크로우가 연기한 막시무스 장군의 비극적 인생 역정과 처절한 복수는 액션 영화에서 느끼기 힘든 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주역인 러셀 크로우와 리들리 스콧 감독이 다시 뭉쳐 만든 <로빈 후드>는 <글라디에이터>처럼 큰 스케일의 서사극이기에 그때의 감동을 되새기며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차별화"
그런 기대에도 <로빈 후드>는 이미 수없이 많은 작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용의 신선함과 재미적 요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로빈 후드>하면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했던 작품이 떠오를 정도여서 그 작품과의 차별성은 새로운 <로빈 후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점이었을 겁니다. 그때문에 이번 작품은 기존 작품들과 달리 로빈 후드가 영웅이 되기 전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평민 출신이었던 로빈 롱스트라이드가 기사인 로빈 록슬리로로 변해가는 과정을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풀어가듯 현실감있게 그려갑니다. 거기에 로빈 록슬리의 아내인 메리언 (케이트 블란쳇)과의 로맨스도 적절히 섞어 거친 사내들의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속 아기자기한 재미도 선사합니다.

"스팩터클과 리얼리티"
차별화에 따른 변화의 시도에서도 변하지 않는 점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장기인 스팩터클한 전투 장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영화 오프닝을 여는 성을 함락하기 위한 전투 장면과 대미를 장식하는 프랑스 대군과의 치열한 전투는 이번 작품의 백미이자 최고의 볼거리로 감독도 가장 공을 들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치열한 전투에서 빛을 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러셀 크로우의 활 쏘는 실력으로 작품의 리얼리티를 위해 3개월 이상 활쏘는 훈련과 10kg 감량으로 근육질 몸매를 만든 열정이 만든 결과일 것입니다. 또 12세기 영국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배경도 영화의 리얼리티를 높이고 있네요.
"후속작의 한계"
하지만 <로빈 후드>는 전체적으로 <글라디에이터>를 넘는 작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영 시간과 대작이라는 공통점은 있을 지라도 전투 장면의 긴장감이나 관객의 시선을 빨아들이는 스토리의 흡입력에서는 전작과 비교해 힘이 떨어져 보입니다. 전작에서 선과 악이 분명해 선이 악을 응징하는 복수의 카타르시스는 로빈의 적이 프랑스 군인지 왕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영화의 결말이나 전투에서의 결과도 왠지 밋밋합니다. 로빈의 아버지와 록슬리 가문의 인연과 왕의 부하가 일으킨 변절이 국가간 전쟁을 일으킨다는 설정은 조금 과장되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느낌은 로맨스가 섞여서라거나 주인공의 상황 차이로 인해서라기 보다 어쩌면 일생의 대작을 넘어설 수 없는 후속작의 한계가 아닐까란 생각마저 듭니다.

"국민과 국가"
<로빈 후드>는 시대의 문제를 꼬집는 다큐 영화가 아니 듯 이 작품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감하기에 충분할 교훈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살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은 깊이 새겨볼만 합니다. 그런 점과 함께 전작에서 '복수'가 재미를 이끄는 핵심이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독재와 부패가 있는 세상에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영웅의 탄생 과정을 말하고 이제 그 영웅담은 서막을 열었습니다. 조금 아쉬웅믄 남을지라도 언젠가 배우와 감독이 다시 의기투합하여 만들 새로운 이야기는 분명 전작을 뛰어넘는 역작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만들고 또 만들어라. 후속작이 전작을 뛰어 넘을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