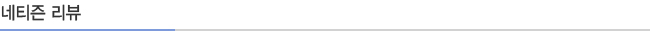|
이 영화도 미루고 미루워 오늘에서야 정신 차리고 제대로 봤다.
정확하게 3번 시도 끝에 이룬 결실(?)이다.
한번은 그냥 건너 뛰기로 보고 - 그것 참, 화면 한번 다케시 감독 닮았네...
두번째는 마누라도 졸고 나도 졸고 - 당채 무슨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거여...
세번째는 결국 마누라는 또 졸고 나는 전율을 느끼고 - 말이 필요 없다 감동이다.
영화의 그 감동을 식히면서 어줍잖은 머리로 영화를 되짚어본다.
마모루 아자씨의 다른 영화들 처럼 철저하게 허무주의적인 인간관을 여기서는 그래도 적게 보인다. - 아니 그래도 희망은 인간에게 있다고 해야하나 - 그렇게 읽고 싶다.
혹자들은 SF 영화의 오마쥬들 결정체라고 많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스토리부터 화면까지 모두 낯설지 않다.
그래서 다시 질문한다.
'과연 SF는 끝까지 저런 식으로 인간의 획일화에 대한 비판, 로봇(AI)과 인간과의 대립,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 이런 이야기들만 하면서, - 그것 봐라 너네들(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 이렇게 살면 훗날 저렇게 될 것이다. 조심하라는 식의 마치 자기는 외계인인것 처럼 이야기하는 - SF의 획일성까지 경의를 표해야(오마쥬) 했을까?'
- 내가 쓰고도 정리가 안되네... :(
대학 생활을 내가 빈 구호를 외치더라도 나의 외침이 세상을 바꾸는 것에 일조할 것이다는 '뜨거운 망상'에 젖어 보냈던 이들에게는 지극이 자기 실존적인 이 영화는 그렇게 와 닿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반면, 모든 촛점이 '자기'에게 맞추어진,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저들과는 약간 다른 이들에게는 꽤 의미심장한 영화가 될지도 모르겠다. - 어쩌면, 이런 허무맹랑을 보라고 시간 아깝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딴 이야기, 그 테마송 한번 사람 간장을 녹이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