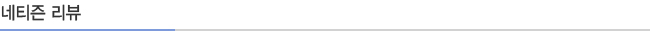|
사랑과 일은 평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울을 닮았다. 양쪽에 공평한 무게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사랑에 성공하면 일이 엉망이 돼 있고, 일에 몰두하면 사랑은 지친다. 내놓고 자랑할 전성기도 없이 은퇴기를 맞이한 테니스 선수가 한 여자를 만나면서 커리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지레 ‘영화니까 가능할’ 어떤 한 가지 결론을 상상하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한 고비, 한 고비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두개의 트로피를 모두 거머쥐는 인생. 이 점에서 영화 <윔블던>도 사랑과 일 중 적어도 한 분야에서는 절룩거리는 만인을 위한 싱그러운 판타지다.
피터 콜트(폴 베타니)는 커리어의 석양을 바라보는 영국의 테니스 선수다. 생애 최고 전적은 세계 랭킹 11위. 지금은 119위로 풀썩 내려앉았다. 부유한 아낙네들의 시간강사가 되어 선수 말년을 정리하는구나 싶었던 그는, 정말 운이 좋게도, 와일드 카드(출전자격을 따지 못했지만 특별히 출전이 허용되는 선수나 팀) 자격으로 윔블던 대회에 출전한다. 게다가 미모의 미국 출신 테니스 스타 리지 브래드버리(커스틴 던스트)와 가까워져 데이트를 즐기는 겹경사까지 맞는다. 리지는 “가볍게 만나자”라는 말로 관계를 시작했지만 사랑의 힘은 아무래도 위대한 것인지,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피터는 은퇴 전 마지막 윔블던에서 난데없이 승승장구 퍼레이드를 펼친다. 딸의 선수생활을 엄격히 관리하는 리지의 아버지 데니스(샘 닐)는 피터와 반대로 페이스가 흔들리는 리지를 걱정해 둘의 연애에 간섭한다.
스포츠영화와 로맨틱코미디의 관습을 따르면서도 <윔블던>은 익숙한 것을 빼고 새로운 것을 채운 영화다. 꿈같은 사랑이 찾아와 생기를 얻은 피터가 없던 투지를 발휘해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돼 연습을 하고 멋진 기량으로 상대 선수를 넘어뜨리는 광경은 여기에 없다. 피터에게 힘을 준 것은 열정적인 리지와 밤낮 구분없이 나눈 섹스다. “시합 전의 섹스가 경기에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긴장도 풀어주고.” 여유만만한 리지의 말처럼, 처음엔 적응이 안 돼 후들거렸던 피터의 다리는 점점 곧게 펴진다. 자막은 국내 관객의 정서를 고려해 순화된 번역을 지향하지만, 리지가 던지는 성적인 농담들은 오리지널 스크립트에서는 훨씬 적나라하고 재기발랄하다. 실은 피터의 기대 밖 선전이 온전히 사랑의 힘만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다. 상대편이 발목을 접질리거나 네트에 공을 꽂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번외 선수에게 기적은 없었을 것이다. 영화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우연을 <윔블던>은 제법 현실성 있게 플롯에 반영하고 뜻밖의 유머로도 활용한다.
이런 재치있는 감각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요소는 피터 콜트라는 캐릭터다. <윔블던>은 전적으로 피터의 이야기다. 영화는 피터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해 끝을 맺는다. “내 삶도 공처럼 빗나갈까 두렵다”고 한숨짓던 피터의 자의식은, 경기의 중요한 고비마다 바보처럼 울부짖는다. “지난 4년간 매일 250개씩, 600만개의 서브를 연습했다…. 내 목표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제발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스포츠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경기의 긴박감의 절반을 <윔블던>은 퇴물 선수의 소심한 내면의 목소리에 할애하고, 피터는 뒤늦게 인정받은 천재로도 어줍게 겸손 떠는 승자로도 나아가지 않는다. “위대한 선수들은 뭔가 다른 게 있어”라고 생각해온 그는 자신의 성공가도를 자각하기보다 “리지는 정말 달라” 정도를 생각하고 만다. 이 어이없고도 귀여운 남자를 연기한 사람은 영국 배우 폴 베타니다. <도그빌> <뷰티풀 마인드> <마스터 앤드 커맨더: 위대한 정복자> 등에 출연해온 그는, 이 영화를 통해 휴 그랜트만이 납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았던 워킹 타이틀표의 사랑스러운 영국 남성을 세계 관객에게 선전할 수 있는 대안이 됐다.
생기발랄한 장점을 가졌지만 <윔블던>의 절반은 분명히 구식이다. 자신의 상처는 뒤로하고 상대방에게 격려와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연인, 사윗감의 진심을 믿어 딸에게 최후 선택의 기회를 양보해주는 아버지, 일과 사랑의 트로피를 두손에 쥐는 남자. 로맨스와 스포츠를 소재로 한 영화라면 없어서는 안 될 위기와 그 해결과 감동은 별다른 고민없이 만들어진 구조다. 오랜 불화 끝에 화해한 기념으로 부엌에서 사랑을 나누는 피터의 부모도, 형 대신 상대 선수에게 내기를 거는 철없는 동생도 기능성보다 장식성의 의미가 큰 캐릭터들이다. 대신에 <윔블던>은 피터 콜트의 결승전을 담은 마지막 14분짜리 시퀀스에 스포츠영화로서 갖추어야 할 상업적 미덕을 교과서처럼 공들여 집약해놓았다. 피터에게 감정이 이입된 이상 그 긴장된 순간을 체험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며, 그것은 영화의 절반을 예상하고 간 관객이 누려야 할 당연한 재미이기도 하다. (박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