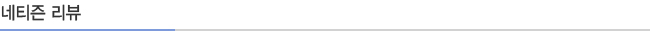어느 순간부터 한국공포는 반전이 없이는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며 악담이 늘어났고, 올해 개봉한 <전설의고향> 또한 평이 좋지 않았다. 그래도 매년 100만 관객 이상 영화를 만들어내며, 한국 공포영화가 맥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올해는 불안하나 했더니 이제 황정민이 그 한국 공포영화의 맥을 다시 살리고 있다. 18세 관람가를 받을만큼 잔인하지만, 여태까지 봤던 우리나라 공포영화와는 조금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 원작을 바탕으로 한국 공포영화의 재탄생!!
"한국공포영화=놀라는영화" 거의 공식이 아닐까? 우리나라에서는 <데스티네이션>시리즈처럼 독특한 소재가 아닌 늘 "한"이 담긴 그런 영화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그런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니까 계속 만들었겠지만, "한" 이라는 틀에 갇힌 영화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검은집>은 "싸이코패스"라는 독특한 소재로 한국 공포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물론 원작이 일본 소설이라는 점이 아직 소재 고갈에 대한 해결책일지 의문점이 남아있겠지만, 글로벌 시대에 헐리우드에서 계속 동양영화를 리메이크를 하는 도중에 그렇게 따지는 것도 이상하겠다. 내용을 빌리긴 했지만, 원작이 너무 튼튼했기 때문인지 각색을 잘해서인지 영화는 놀라는 영화만 공포영화는 아니다를 분명하게 보여준 작품이었다. 누가 죽이려는 사람이고, 누가 도망치는지 알고 있고, 갑작스런 등장이 없음에도 무섭고, 눈을 감아야 하고, 소리를 질러야 하고, 연신 몸을 움츠리게 된다. 18세 관람가를 판정받을만큼 잔인한 장면도 공포에 한몫을 단단히 한다. 특히 그 잔인한 장면과 집요하게 쫓는 범인으로 인해 더욱 오싹하게 느끼고, 공포에 활기를 불어넣지 않았나 생각한다.

반전!! 그리고 더 무섭게 진행되는 이야기, 그 이후...
역시나였을까? 이 영화 역시 반전이 나오긴 한다. 물론 이번 영화는 반전이 핵심은 아니다. 보통 반전이 마지막에 뒤통수를 치는 것과 달리 <검은집>은 중반부에 이미 반전을 찔러 넣은 상태에서도 관객들이 계속 영화에 집중을 할 수 있게 얘기를 전개시킨다. 반전을 미리 눈치챈 관객이라도 그 재미가 다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그 반전 때문에 더욱 무서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다! <검은집>은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다. 살인범이 누구인지 알아채는 50분과, 살인범이 누구인지 알고 그 놈과 싸워야 하는 50분으로.. 영화 속에서 황정민은 누가 살인범인지도 알고 있음에도 계속 당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누가 범인인지 알고 있음에도 계속 어떻게 진행될지 가슴 졸이고, 영화에 더 집중을 한다. <검은집>은 뒷부분에서도 한 번 더 뒤통수를 때리게 되고, 그렇게 영화가 결말 짓나 했더니 마지막에 꼬마가 한 말이 더 가라앉았던 팔뚝의 털들을 더 솟구치게 한다. "내가 강아지를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는 상상에 맡긴다.

배우들이 연기가 더 소름끼치게 하다
"강신일" "유선" 의 연기 또한 100점 만점에 99점을 줘도 모자르지 않다. 초반에 "강신일'의 연기로 관객들은 혼동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연기의 힘이 실려 있었고, 그에 대응하는 소심한 보험사정인 "황정민" 또한 어떤 때에는 "유"하다가도 무섭게 표정을 바꾸면서 딱 부러지는 대응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원작자한테도 박수를 받았다 한다. 특히 "유선"은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무서운 눈빛 연기 뿐만 아니라 혼신의 힘을 쏟았는데, 재작년에 찍은 <가발>에서의 연기를 훨씬 능가하며, 관객들한테 완전 순도 100% 소름을 선사했다.

우리나라에서 공포는 홀대받기 쉬우면서도 여름시즌이면 늘 꾸준히 나오고 있는 장르다.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이 300만이 넘는 <장화,홍련>이라 해도, 흥행에 있어서 늘 100만 이상이면 잘 왔다고 생각을 하곤 한다. 그러나!! <검은집>은 18세 관람가인데도 불구하고, 탄탄한 스토리, 무섭게 다가오는 배우들의 연기,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200만을 넘으리라 생각한다. 여태까지 봤던 한국식 공포영화와 다름이 분명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영화 속 장면들이 꿈에 나오지 않을까 소름 또한 느낄 수 있겠다. 과연 어떤 영화길래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보이는가는 극장가서 팔에 소름돋은 사람만이 알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