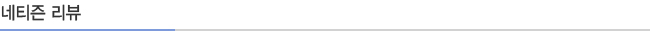|
고마움과 사랑을 깨달았을 땐 왜 항상 늦는 것일까? ★★★☆
고교시절부터 글 솜씨 하나는 알아줬지만, 온갖 말썽과 사고를 치고 다닌 29살의 애자(최강희). 서울에 올라와서 경향신문 공모전에 작품을 내보지만 예전 지방신문 수상이 걸림돌이 되고, 하나 밖에 없는 애인은 바람을 피다 걸려 관계를 쫑낼까 생각 중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얼굴만 마주 대하면 싸우던 엄마가 암이 재발해 쓰러진다. 더 이상 삶의 희망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챙겨야 하는 애자는 눈물과 회한 속에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를 한다.
개인적인 경험 때문인지 가족 중 누구라도(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영화를 볼 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간다.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 그런 장면은 내 시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사실 <애자>의 스토리는 뻔하디 뻔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 어떤 결론으로 다다를지는 굳이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럼에도 개인적 경험을 떠나서 <애자>는 충분히 괜찮은 영화다. 그건 어쩌면 엄마의 사랑은 퍼내고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기 때문일 테고, 김영애와 최강희의 연기는 내 돈과 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정도로 좋다. 특히 죽음을 다루는 영화가 전반적으로 내내 명랑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도 오히려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든다.
<애자>의 가장 큰 즐거움은 우선 좋은 배우들의 좋은 연기를 보는 것이다. 김영애야 워낙 뛰어난 연기자인 만큼 그의 연기를 재론하는 건 무의미할 것 같다. 하지만 평소 최강희의 경우,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건 배우로서가 아니라 좀 유명한 사람(?)으로서다. 흔히 4차원이라고 부르는 독특함의 매력 때문이랄까. 배우로서 좋아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최강희의 연기가 딱히 연기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자연스러운 연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연기자로서의 정체성이나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소리다. 이건 최강희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는데, 난 그녀가 배우로서의 정체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다. 그런데 <애자>에서의 최강희는 이전에 내가 알던 최강희와는 좀 다르다. 정말로 연기를 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연기를 위해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보인다. 나이 30이 넘은 배우가 노력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어쨌거나 참 보기 좋다. 둘만이 아니라 <애자>에 출연한 배우들의 연기는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에 잘 섞여 있다.
두 번째, 슬픔을 억지로 짜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애자>는 신파적 요소가 강하다. 모든 신파를 부정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면 이 정도의 신파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리라. 영화는 전반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는 있지만, 유쾌하고 밝고 명랑하다. 크게 터지는 한 방은 드물지만(애자가 맞선남(김씨) 앞에서 ‘구지가’를 읊는 장면에선 정말 크게 터진다) 객석에선 끊임없이 자잘한 웃음이 터질 정도로 유머러스하다. 유머러스한 분위기에서 슬픔으로 넘어가는 흐름도 자연스럽다. 중간에 툭 던져놨던 유기견 안락사 논란을 엄마의 마지막 모습으로 연결시킨 부분은 가슴을 너무 아리게 한다. (이 장면에서 떠오른 건 어쩌면 애자의 한자가 哀子일지도 모른다는 거다)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들고는 끝날 때 흐뭇한 미소로 마무리 짓게 만드는 영화를 본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 세상에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보다는 계시는 게 백배, 천배 낫다는 게 내 생각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힘들거나 어려울 때, 가슴에 안겨 편히 쉴 수 있는 존재가 엄마만큼 어디 쉽게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참 묘한 건 나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나이가 좀 들어서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식들의 후회는 한결 같다는 거다. 왜 꼭 돌아가실 즈음이 되어서야 당신들의 고마움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분들의 사랑이 공기 같아서 일까.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