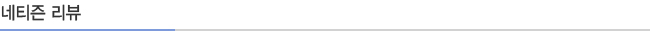|
과연 그럴까. 망각한 자는 정말로 복이 있는 자일까.
사람은 누구나 기억을 안고 산다. 그것이 행복한 기억이든 쓰라린 기억이든
창피한 기억이든간에 사람에게 있어 기억이란 머릿속 한구석에 가지런히
또는 어수선하게 자리한다. 그런 기억들은 때론 불쑥 떠오르기도 하고
때론 개인의 의도에 의해 떠오르기도 한다. 그리하여 개인은 기억의 성격에 따라
웃음 짓거나 눈물 흘리거나 머리를 세차게 흔들어 버린다.
이 기억, 사람들은 이 기억들을 보존하거나 잊고 싶어한다.
좋은 기억은 남겨두어 평생 추억으로 갖고 싶어하고
좋지 않은 기억은 잊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어쨌든 사람은 기억을 잊기 마련이다. 모든 기억을 가진 이는 없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해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기억을 잃어간다. 자연적인 망각에 선택은 없다.
좋은 기억이 사라질 수도 나쁜 기억이 사라질 수도 있다.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기억이 사라질 수도 있다.
어찌됐건 랜덤 방식으로 기억을 하나하나씩 지워나가는 망각은 정말 복인 것일까?
<이터널 선샤인>에 등장하는 '니체'의 말은 언뜻 맞는 말인 것도 같다.
'니체'가 저 격언을 얘기할 때의 정확한 상황과 뜻은 내 알지 못하나,
적어도 저 말 자체로 놓고 보면 말이다. 실수란 단순한 잘못이기 이전에
수치심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모두가 잊고 싶어하는 기억의 한 종류다.
그러나 실수에 대한 기억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일까.
많은 사람은 실수를 그냥 실수로만 남겨두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학습한다.
그러니까 실수의 경험은 예방접종이다, 같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없어져야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기억도 마찬가지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 기억이라 실감하지 못 할 뿐이다.
자신에게 그런 기억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마저 잊게 되니까.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많은 영화 속의 인물들은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나서기도 한다.
왜 그럴까. 그건 바로 기억이란 자신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잊혀지기 싫어한다. 상대가 소중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나 기억나니?"라고 묻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만약 그 사람에게 "너 기억 안 나"라는 대답을 들으면 얼마나 섭섭한가.
<여고괴담 死 : 목소리>는 잊혀짐의 공포를 소재로 하고 있다.
<여고괴담>에서 '진주(최강희)'는 잊지 않겠다는 '지오(김규리)'의 말을 듣고 사라진다.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에서의 교환일기는 '효신(박예진)'의 기억이다.
↑ 잊혀진다는 것의 아픔.
'조엘(짐 캐리)'은 '클레멘타인(케이트 윈슬렛)'과의 기억을 지우려 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프롤로그가 지난 후의 눈물 흘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또는 '클레멘타인'이 자신의 기억을 지웠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이기도 하다.
사랑했던 누군가의 기억에서 지워진다는 것. 그리고 헤어진 사랑의 괴로움.
그가 기억을 지우려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시술 과정 중에 비로소 깨닫는다. 자신의 지우려던 기억은 행복했던 추억임을.
'조엘'은 지겹게도 싸워대던 기억 속에서 그땐 몰랐던 행복을 찾고
기억 삭제를 필사적으로 피해 다닌다.
어쩌면 기억 삭제 작업이 최근의 일부터 지워나가 그런 것은 아닐까.
아프고 화났던 기억은 점점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변해간다.
그럼으로서 강한 잔상으로 남는 것은 사랑할 때의 행복함이다.
이쯤되면 망각하는 자가 꼭 복 받은 자는 아닌 것 같다.
자신의 과거, 흔적 사이에서 일정 부분을 도려낸다는 것은 분명 허망한 일이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일, 함께 갔던 곳, 함께 먹던 음식, 함께 했던 시간.
'하워드(톰 윌킨슨)'를 사랑했던 기억을 지운 '매리(커스틴 던스트)'에게
'하워드'의 부인은 말하지 않는가. "불쌍한 아이"라고...
그럼에도 마음은 기억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모양이다.
'매리'는 '하워드'를 다시 사랑하고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다시 만난다.
그것도 둘이 처음 만났던 몬톡에서. 심지어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기억을 지웠던 사실을 알게 되고 '하워드' 앞에서 서로를 비난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건 상대방에게 아주 잔인한 일이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가장 심한 독설을
간접적으로 듣는 일이란 얼마나 치 떨리는 일인가.
그럼에도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다시 시작하려 한다.
사랑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서로를 싫어하게 될지까지 알면서 말이다.
그래. 마음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감정을
명확히 정의내릴 수 있었겠지. 수많은 시인과 작가가 사랑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지.
기억은 삭제되도 마음은 남는 법이다.
그러나 내 눈엔 그들이 누워있는 곳이 별자리로 보인다.
그곳은 그들만의 우주이고 그 속에는 그들만의 별자리가 있다.
<이터널 선샤인>은 100% 사랑 영화다.
다만 다른 영화보다 개성 넘치고 기발할 것이 차이랄까
('찰리 카우프먼'과 '미셸 공드리'의 힘이란!).
이 영화는 바로 위에서 말한대로 "기억은 삭제되도 마음은 남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 줬다.
억지로 잊으려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과연 여기에 답이 있는가. 답은 각자의 마음에 있는 것일까.
분명 <이터널 선샤인>은 더없이 탁월한 영화지만,
위의 질문이 안그래도 힘든 나를 더욱 심란하게 했기에
<My Best Movie>가 아닌 <외국영화 끄적이기>에 이 감상을 올린다...
이번 단편 영화 리뷰에 참고할까 싶어 봤는데...
아, 괜히 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