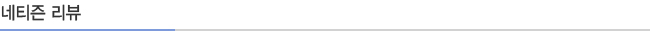|
교복치마 밑에 체육복 바지를 받쳐입고
비오는 날이면 학교 땡땡이 치고 바다로 놀러가는 애자.
글쓰는 재주 하나로 대학까지 가지만
등단하여 공인된 작가가 되는 일은 멀게만 보인다.
게다가 성격은 참.... 말빨하며, 아주 가관이다,
강렬한 사투리가 번쩍번쩍 빛날 정도다.
애자의 엄마는 남들이 뭐래든 자기 소신 가지고 일을하며,
직책이든 위치든 상관없이 자기 할바를 다한다.
할말 다하는 건 물론이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까지 있는 걸
딸에게 제대로 물려준 것 같다.
그 둘이 만들어 내는 이야기. 초반부터 불꽃튀긴다.
말로 투닥거리는 것은 애교 수준. 온 몸으로 저항하고 두드려패는 게 아주 실감난다.
그런 엄마가 아프다.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까지 간다.
엄마말마따나 시집이나 가면 딱좋게 글쓴답시고 백수노릇하는
20대 후반의 딸.
그녀는 집안 형편이 걱정되고 자기의 미래도 캄캄하고
엄마의 병간호는 피하고 싶기도 하지만 자신이 잘 해내고 싶은 욕심도 있다.
엄마를 수술하라며 들들 볶다가도, 하고 싶은 게 무어냐며 함께 해주고,
죽음이 임박한 엄마의 숨통을 틔워주고, 아파 골골대는 엄마를 웃게 해주는,
그런 딸.
그렇게 딸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와중에 성장하는 그 모습이
신파에서 맛보기 힘든 속 깊은 감동을 준다.
제대로 치고받는 모녀의 마지막 나날들이, 슬프지만 담담하게 마무리지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