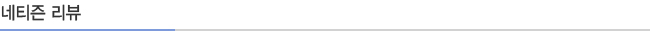|
70여년 전 한 감독은 자신이 시나리오를 쓰고, 자신이 주연하고, 자신이 편집하고, 자신이 영화에서 쓰일 음악을 직접 작곡하고 이렇게 해서 믿기지 않을 영화 하나를 만들었다.
요즘 세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잊혀져 버린 한 야구투수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저 대공황시절 - IMF 시절 - 청년실업이 몇십만의 시대 - 예나 지금이나, 삼류인생에게는 언제나 구질구질한 그 시대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어떻게든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는 한 소시민의 이야기.
식상하고, 지루하고, 짜증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 없이 이런 영화를 찾는다. 그리고 애써 잠시나마 로멘티스트가 되어 고달픈 자신의 삶을 위로 받고 싶어한다.
이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훌륭하다. 상위 3 퍼센트의 전쟁에서 처음부터 제외된 자들을 위한, 아니, 종자돈 만들기 조차 꿈꿀 수 없는 이들을 위한, 그들만의 이야기가 내게는 구질구질하고, 식상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온다.
몇 해전 본 반칙왕을 기억해 본다. 그 처절했던 코미디를. 아마 이런 코미디의 교과서가 이 영화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