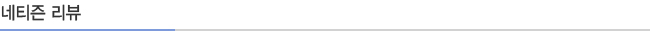|
1) 김기덕은 왜 빈집을 택했는가?
주인이 부재하는 빈집은 제도의 구속에서 벗어나 안식할 수 있는 곳이다.
女子는 제도의 불합리한 폭력과 압제에 의해 피폐해지고,
집은 정신과 육신을 구속하는 제도의 틀로 겁탈하려하기에
탈출마저 꿈꾸지 못하는 무력감으로 집안 구석구석 웅크리고 있다.
여자는 제도에 억압당하는 우리 현대인의 얼굴이다.
남자는 탈출하는 꿈 그자체이다.
2) 골프공은 저항의 왜곡된 수단인가?
골프는 제도를 유지하려는 자의 폭력적인 연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도의 틀밖에서 방황하는 남자는 폭력으로서 저항하려한다.
그것은 지나가는 무고한 자의 상처를 부르는 때때로 씻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얼룩질 수 있음을 영화는 잠시 상기시킨다.
하지만, 결국 제도유지의 충실한 하수인인 형사는 본인이 방관한
골프공의 폭력에 스스로 응징당한다.
3) 빈집의 주인들은 누구인가?
사진작가의 집은 제도에 의해 해체된 자아, 즉 여자는 완전해체된후
성적도구로만 존재가치가 인정된 곳이고,
권투선수의 집은 제도에 의해 눈이 먼 자아, 잔인함의 희열로
제도의 억압을 잊게하는 곳이다.
노인이 죽어있는 집은 제도가 권력의 시녀로서 약자에겐 조력하지
않는 방관자적 입장에 서 있는 곳이고,
장난감권총으로 장난치는 아이가 있는 집은 제도가 폭력의 도구를
만들어 폭력을 정당화하는 곳이다.
하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운 한옥은 유일하게 여자와 남자가 안식할
수 있는 비어있지 않은 집이다.
영화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이 비어있지 않지만
평화롭고 자유로운 한옥, 즉, 제도로부터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재가능한
곳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4) 남자는 왜 유령이 되는가?
세상은 제도에 의해 움직인다. 비어있지 않은 '제도'라는 주인의 (부재가 아닌)
부존재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다.
이때, 영화는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주인이 돌아온 것이다.
남자는 제도의 틀속에 자아를 숨기고 사는 서글픈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자아를 잃고 거대한 조직 및 권력체계와 매스미디어에 의해 대량제조된
조립식 건물속에 존재유무가 불분명한 유령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