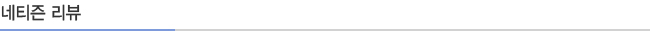|
어제 왕의 남자를 두 번째로 보고 와서, 떨리는 가슴을 안고 리뷰를 씁니다.
너무나 훌륭한 수작이라서 리뷰를 쓰는 것마저도 조심스러워 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시대’ 를 매우 좋아합니다.
조선은 양반들의 보수적 유교 사상과
서민들의 자유방임적 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대비되는 시기입니다.
남자와 여자, 양반과 백성, 부(富)와 가난...
조선이라는 시대는 모든 것을 양극화 시켜버리는,
아주 이중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남자>는 작품의 배경을 이러한 조선으로 선택함으로써
왕으로 대변되는 ‘권력’ 과 광대로 대변되는 ‘자유’의
극명한 대립을 훨씬 더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영화는 다른 시대극에서 단 한번도 시도하지 않은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광대가 주인공이라는 점,
슬픈 광기를 가진 연산군의 캐릭터 설정,
연산과 녹수를 왕과 후궁이 아닌 부부라는 대등한 관점에서 바라본 것 등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자유와 권력을 모두 소유하고 싶었던 연산과
그를 포용하고 싶었던 공길,
단 한순간이지만 광대는 ‘배만 부르면 된다’ 는 생각으로
한곳에 안착하려 했었던 장생,
연산을 빼앗긴 녹수.
이렇게 궤도를 이탈한 네 개의 욕망이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종반부로 갈수록 영화는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길에서 너무 많이 비껴왔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이미 운명은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은 녹수의 치마폭에서 광대들을 바라보며,
광대들은 그들의 자리인 반 허공의 줄 위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화는 는 네 주인공의 죽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허공으로 뛰어오르는 장생과 공길의 모습을 비추며 끝이 납니다.
얼마 전 이준익 감독의 인터뷰를 보다가,
감독 스스로 이 엔딩씬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딩 장면에 대한 이준익 감독의 자신감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엔딩씬은 관객들의 가슴에 커다란 여운과 아주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러티브상으로 장생과 공길은 죽었지만
그들의 시간은 줄 위로 뛰어오른
그 때에 멈춰버린 것이라는 감독의 말이,
영화관에서 느꼈던 그 뭉클함으로 제 마음을 다시금 벅차 오르게 했습니다.
영화를 첫 번째 봤을 때는 공길로 분한 이준기의 연기가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기파 배우라고 하기엔 이르지만,
신인으로서 정말 놀라운 연기력을 보여주더군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땐
연산군 정진영의 연기가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영화 속에서 연산군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연산군이 되어있었습니다.
그의 연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네요.
왕의 남자가 가진 매력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 조연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 빈틈없는 구성,
모든 시대극이 그러하겠지만 옛 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매력 또한 지나칠 수 없습니다.
굳이 아쉬운 점을 찾자면 내용 전개가 조금 촉박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준익 감독이 말하는 ‘자유’ 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자유’ 란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와 지배라는 말자체가 속박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연산은 여자도 남자도 될 수 있는
공길의 그 자유를 사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비록 공간은 과거였지만 그들이 보여준 웃음과 눈물은
지극히 현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가장 민족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영화.
저는 왕의 남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네요.
** 부족한 리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