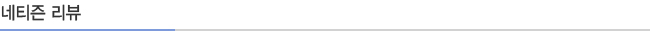옛말에..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를 말이 있다. 그 말의 진리는 본인 자신은 모른다. 그 끝은 너무나도 처절했기에 (적어도 지금까지는 ^^;;) 본인이 살아남아서 그 장면을 보았다고 장담은 못한다. 그냥 제 3자가 본 관점에서 그렇게 됐다고 전해지는 말이 전부이다. 그리고 우리는 약했던지 또는 강했던지 간에, 경험을 해 본적도 있을 것이다.
처음 이 영화에 대해 듣거나 접한 것은, 지난 신세기를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영화 <공동 경비 구역(JSA)>의 박찬욱 감독이 회심의 4번째 영화이고, 그 누구의 얘기가 아닌.. 정말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고 싶어해서 내놓게 된 작품이라고 출사표를 던졌을 때였다. 그 후, 간간히 들려오는 캐스팅 소식이며, 촬영 단계를 차근차근 들은 지 6개월여가 지났을까.. 영화의 완성이라는 소식과 함께.. 가까운 영화사에서 근무하는 후배로부터 스토리 북을 얻어 보게 되었다.
첫 페이지부터.. (스토리 북이 이런 거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펼쳐지는 카메라 위치, 배경, 장소하며, 배우들의 대사를 나타내는 그 섬세한 표현은 필자를 이 영화에 빠지게 했다. 그 책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른다. 사실, 마지막 장에 배우들 연락처, 감독님 연락처도 있었지만, 차마 유출할 맘은 없었다. 그저 이 영화를 느끼고 또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나서, 영화 예고편을 접했을 때.. 강렬한 바이올린 소리에 펼쳐지는 잔잔하고도 열정적이기까지 화면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기회를 놓칠세라 기자 시사회가 있던 날.. 필자는 러닝타임 내내 감격했고, 약간은 등골이 오싹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이미 스토리 북에서 보았던 그 시퀀스 시퀀스가 내 눈앞에 하나의 커다란 화면으로 펼쳐질 때는 나도 모르게 탄성까지 자아냈다. 이 장면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며 뱉어내는 숨죽인 탄성을 뒤로하고도 깜짝 깜짝 놀랠만한 영화적 장치는 역시, 책으로 읽고 상상만을 하던 필자의 머릿속을 한 순간에 일렬종대 시켜버렸고 그 장면들이 아직까지 (시사회가 지난 지 1주일 되씀) 생생하게 남아있다.
영화적 내용은 상당히 간단하다.. 이러쿵 저러쿵 해서 이렇게 복수를 하니까, 바로 돌아오더라.. 라는 식이다. 한 마디로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것도 없이 시종일관 복수로 점철된 이야기이다. 영화는 복수를 표면으로 내세웠지만, 필자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회의 부조리를 보게 되었다. 복수를 왜 하게 되느냐에 질문을 던진 것이다.
사회적 약자가 있다.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 친지, 친구가 될 수도 있다. 늘 당하고만 사는 그가 어느 날 일어섰다. 사회에 소리쳐봤자 돌아오는 것은 빈 메아리뿐이었던 그가 좋은 유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마지막을 고(告)한다. 근데 하필, 아무 죄 없는 네가 될 줄이야.. 그렇게 꼬여버린 실타래는 좀처럼 풀릴 기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엄청난 눈덩이를 몰고와 너도 살 수 없고, 나도 살 수 없는 눈사태를 일으킨다. 그 이면에 감춰진 사회적 부조리는 바로, 물질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부익부 빈익빈이었고, 사람의 목숨도 물질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지난 15일에 개봉되었던 <존 큐>라는 영화를 알고 있는가.. 이 영화 역시 겉으로 잘나가는 미국의 내부를 파헤쳐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물론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화를 포장하고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셨지만, 관객들 대부분은 영화에 이야기를 제공해 준 사회의 또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복수는 나의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은 누나를 살리기 위한 작은 소망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를 외면한다. 그 외면으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되고, 그 결과는 모두에게 참혹한 결과를 안겨준다. 누구의 승리도 없었다. 다만, 패자만 있을 뿐이다.
그 사회를 고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도 함부로 말 못할 것이다. 그럼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됐냐고 물어본다면, 그 역시 할말이 없다.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 꾸준히 탁상공론을 하고는 결국 결론을 못내리는 쥐와 같이 우리는 그저 바라볼 뿐이다. 누군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현실과 싸우는 것이다. 종종, 방울을 달기는 하지만, 그건 고양이가 아니고, 사자 갈기에 요만한(|--|) 방울 한개 단거나 마찬가지로, 미비한 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러나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이고, 현실인 것이다. 분개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가끔 사회에 경종이라며 ‘용기있는 행동’ 이라고 매스컴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때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감 못하는 부분이 더러 있다. 필자 자신도 ‘이대로가 좋아요’ 라고 복지부동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 생활에 안주하는 것은 사실이다. ‘변화의 바람’도 바래보지만, 어디까지나 바램일 뿐이다. 직접 나서지는 못하는 것이다.
영화 <복수는 나의 것>도 일종의 사회에 대한 간접적인 경종이라고 하면, 경종이겠으나.. 어린이 유괴라는 잘못된 방법(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이 관객에게 동정론을 이끌 수도, 또는 없을 수도 있다. 그저 사회의 부패된 면을 잠시 들춰냈다가 바로 덮어버린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글쎄.. 결론이라는 것은 없다. 사회가 그저 만만한 곳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저 뇌리에 남을 뿐이다.
www.onreview.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