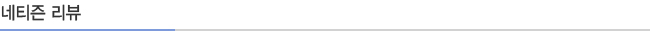흔히들 3각관계라고 지칭하면, 사랑 이야기의 최대 변수라고 한다. (물론 4각관계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가장 아슬아슬하고 마음 졸이는 이야기는 대부분 3각관계이다.) 그 3각관계는 십중팔구 잔인한 결과를 불러 오기 때문에 그리 달가운 사랑법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가오는 수가 많고 그 뜻하지 않은 관계로 말미암아 적어도 자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뿐인 영광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 정글의 법칙을 우리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도 무수히 경험한다. 때로는 우정 사이에 그 몹쓸 것이 끼어들어 우리는 고뇌와 번민을 하기도 한다. 왜.. 노랫말도 있잖은가. ‘사랑과 우정 사이’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영화 <연애소설>은 그런 심각한 분류의 3각관계는 지향하지 않는다. 계절로도 시기적절하게 가을에 맞는 영화로서 손색이 없다.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런 천혜의 자연 경관과 건물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름다운 배경과 그에 걸맞는 각본까지 함께 만든 감독의 연출 솜씨는 신인 감독이라고 감히 폄하를 못할 정도이다.
어느 날부터 인가 ‘지환(차태현 분)’에게 발신인을 알 수 없는 편지가 배달된다. 해맑은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담은 흑백사진과 몇 자의 글귀들. 비누냄새 가득한 편지에서 지환은 보고 싶은 옛 두 친구를 떠올린다. 5년전 대학 선배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지환의 카메라 프레임속에 불쑥 두 여자가 들어온다. ‘수인(손예진 분)’과 ‘경희(이은주 분)’, 다른 듯 닮은 단짝친구였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불꽃이 튄 지환은 용기를 내어 사랑을 고백하지만, 정중히 거절당한다. 그 인연을 이대로 끝내버릴 수 없었던 지환은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 친구하자고 제안을 하고 그 순수하고 당당한 모습에 수인과 경희는 마음을 열게 된다.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들이 흐른 어느 날, 사랑과 우정사이에서 서로 혼란을 느낄 때쯤 수인과 경희는 지환을 떠나게 되고, 5년이 흐른 지금도 아직 그 시간들을 잊지 못하는 지환은 두 친구들의 기억을 찾아 나서게 되고, 그 과정속에서 아름답지만 슬픈 비밀을 마주하게 된다.
연애소설.. 제목따라 영화적 과정도 지환과 수인, 경희의 풋풋한 연애담을 담은 거라고 생각한 필자의 생각은 여지없이 깨져 버렸다. 그에 못지않은 진부한 3각관계 때문에 괜히 영화적 이미지마저 퇴색할 줄 알았지만, 그 모든 것은 영화속에서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럼, 영화 제목을 잘못 정한 것 아니냐고... 전혀 그렇지 않다. 영화는 소설로 읽을 수 없는 깊은 그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었다. 무엇인가를 읽어서 눈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 장면 장면 하나를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것은 책으로 만들어지는 유형의 소설이 아닌, 영상으로 펼쳐지는 무형의 소설이었다.
언뜻 보면, 그 옛날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가 영상으로 재현된 것처럼 수채화 빛 투명한 사랑 이야기 말고도 영화속에는 그들 외에 또 다른 사랑이야기들이 내재되어 있다. 지환의 동생 ‘지윤 (문근영 분)’과 책방 오빠사이에 벌어지는 부끄러운 사랑. 까페 선배의 알콩달콩한 친구 같은 사랑. 우편배달부의 안타까운(?) 해바라기 사랑이 그것이다.
늘 엉뚱하고 럭비공처럼 옆길로 샐 것만 같은 배우 ‘차태현’이 처음으로 보여주는 눈물 연기는 이 다양한 연애담 속에 진주같이 빛을 발하는데, 전반부에는 그답게 쾌활하게 관객들의 엔돌핀을 공급해주지만, 후반부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안타까운 사랑을 가슴 깊숙이 전달해 준다.
여기서 차마 무엇이라고는 밝힐 순 없지만, 그 한가지의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것은 아직 필자도 감성이 남아있나 보다. 이제 그 감성을 느낄 차례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또는 영화를 좋아하는 그 누군가의 차례가 되길 바라며, 끝을 맺으려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