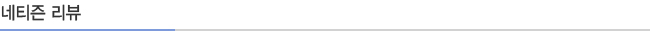|
|
|
|
 jgunja
jgunja
|
 2010-08-20 오후 4:26:41 2010-08-20 오후 4:26:41 |
 1328 1328 |
  [0] [0] |
|
|
1987년에 만들어진 영화 <프레데터>는 당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영화였다. 액션 스타 아놀스 슈왈츠네거가 강력한 힘을 지닌 외계 생명체와 싸운다는 설정은 한창 ‘연출빨’이 서기 시작하던 존 맥티어난 감독에 의해 박진감 넘치게 전개됐다. 영화의 흥행은 속편으로 이어졌고, 하나의 캐릭터로서 에이리언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23년 전에 그렇게 관객을 흥분시켰던 바로 그 영화가 복수형인 프레데터‘스’라는 제목으로 돌아왔다. 게다가 로버트 로드리게즈가 제작을 맡았다니 일단 구미가 당긴다.
알 수 없는 외계 행성에서 정신을 차리는 7명의 사람들. 이들은 용병, 범죄자, 야쿠자, 살인마 등의 캐릭터로 강력한 살의를 지닌 인물들이다. 서로를 경계하던 이들은 공통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로이스(에드리언 브로디)를 중심으로 힘을 합친다. 그곳이 어디인지, 정체불명의 적이 무엇인지 몰라 계속 당하던 일행은 그것이 프레데터라는 것을 알고 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하지만 인간 사냥을 즐기는 프레데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 게다가 인물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면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 진다.
에이리언과 쌍벽을 이루는, 인간 사냥이 취미인 외계 생명체 프레데터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복수형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럿이 함께다.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다. 몸집도 커졌고 지능과 공격력 모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업그레이드 됐다. 이에 맞서는 지구인 일행 역시 무기면에서는 조금 더 진화됐지만 ‘슈퍼 프레데터’들에게는 그저 중화기를 들고 있는 사냥감에 불과하다. 하지만 프레데터의 존재를 인식하고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프레데터>가 줬던 긴장감이나 공포가 확실히 줄어들었다. 알 수 없는 적으로부터의 공포가 사라지니 영화에 대한 흥미로 반으로 줄었다.
프레데터의 존재를 다 공개하고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 후발 주자들은 이들의 대치 상황과 표현 수위를 통해 차별화된 흥미요소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점에서 장기를 살리지 못했다. 머리부터 척추까지 뽑아내는 등의 잔인한 장면이 한두 번 나오기는 하지만 강한 이미지를 남기지 못하고, 마지막 프레데터와 로이스의 대결에서도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등장하며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지만 그저 평범한 대결로 마무리된다. 액션의 강도와 B급 영화 스타일의 잔혹함, 캐릭터의 재미 등 모든 면에서 그다지 주목할 거리가 없는 평범한 영화가 되고 말았다.
영화는 프레데터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의식해 7명의 관계와 팀워크에 작은 반전을 심어놓긴 하지만, 영화의 중심적인 대결구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선만 분산시킨 결과를 낳았다. 그나마 에드리언 브로디, 앨리스 브라가, 토퍼 그레이스, 로렌스 피쉬번 등의 배우들을 보는 것이 작은 재미. 하지만 캐릭터를 절묘하게 표현했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뜻 영화를 옹호하기가 힘들어진다.
어찌됐던 영화는 제작자보다는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프레데터>의 님로드 앤탈 감독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강력하고 공포스러운 프레데터를 만드는데 많은 신경을 썼지만, 그 역시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과거의 영광을 등에 업고 안일하게 만들어진 <프레데터>는 B급 괴수 액션 영화의 중간 단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결과물을 낳았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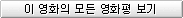
|
|
1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