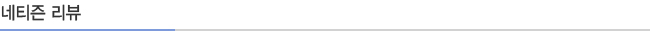|
변화에 대한 갈망, 살아가면서 언제나 느끼는 것이다. 이런 욕망은 현실이 바뀌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 변화 없는 곳으로부터의 탈피는 어느 순간 현대인들의 욕망이자 희망이 되고 있다. 어느덧 현실은 고행이자 비극의 장소가 됐고, 그에 반해 동경의 대상이 된 과거나 혹은 변화를 이끌 미래의 이상향이 현대인의 행복의 시공간이 된 전제 속에서 탈피에 대한 열망이 진정한 행복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 자신의 주변은 변하지 않은 채 있을까? 정말 현실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일까? 두드러지지 않고 작지만, 현실은 분명 변하고 있지 않을까? 행복을 위한 변화가 정말 우리 주위에 없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변화를 현대인은 갈망하는 것일까?
시작부터 볼 수 있었던 화려한 공중전은 일본의 과거를 투영해 주는 것만 같았다. 긴박하고 긴장된 전쟁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쟁은 아니었다. 처음 듣는 회사들의 이권을 위해 그들은 공중전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그들을 처다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무덤덤하다. 아니 관심 없다. 영화 속의 세상은 ‘오시이 마모루’의 영화들처럼 언제나 그랬다. 잿빛의 그림자가 드리우듯 함께 하는 동료들은 있지만 어딘지 모를 고독과 외로움이 존재하고, 그냥 그런 인간관계들만이 존재한다. 그가 없으면, 그녀가 없다면, 또 다른 대안이 다시 재생되고 마는 인간관계, 그렇게 한 개인의 가치는 그다지 중요해보이지 않는다. 그 속에서의 인간들은 그냥 그렇게 살고, 그리고 죽는다. 그리고 죽는 장소는 자기들끼리 중요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냥 그런 전쟁터이다. 그 속에서 시간의 변화는 무의미하다. 누군가 사라지면 바로 교체할 수 있으니 전투기 조종사들의 시간은 사실 같은 시간의 반복이라 여겨질 뿐이다. 그냥 무의미하게 말이다.

오래 살아봐야 할 필요가 없는 그들을 영화에선 ‘키르도레’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그들끼리의 이야기엔 어딘지 모를 허무가 느껴진다. 도플 갱어라고 했던가? 나와 똑 같은 인간이 어디선가 자신의 삶을 산다는 것. 이 영화 속에선 그런 인간들이 많다. 다만 시간의 선후가 다를 뿐이다. 누군가 전사하면 똑 같은 인간들이 그 빈자리를 채운다. 평생 늙지 않도록 안배된 인간 ‘키르도레’는 사실 소모품일 뿐이다. 사라지면 보충되기에 아쉽지도, 그리고 아쉬울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들이 잠시나마 겪는 시간 역시 개별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반적이다. 짧다고 강렬하게 사는 것도 아닌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주역인 유명 회사의 이해에 맞추어져 제작된 인간들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마련한 전투지로 향할 뿐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걱정하지 않는다. 인간적 미련이 있을 뿐이고, 잠시나마 울지 모르지만, 다음의 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평범, 그들이 사는 세상은 그렇게 평범하다. 변할 것도 없기에 무료하기만 한 그들의 세상을 살면서 ‘간나미 유이치’의 넋두리인 ‘나이를 먹을 필요는 없다’는 그의 말은 현명한 것도 같지만 슬프기도 하다. 그들은 결국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 가치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의 삶이 내일도 연장될 것이란 사실에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어른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결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몸소 느끼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직감으로 알고 있는 그들일 뿐이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결코 이런 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자괴감, 그리고 이런 것을 잊기 위해 그나마 Cool하게 사는 것, 그들에게 하루의 생활은 그래서 차라리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지 모른다. 의미가 있다면 그들의 짧은 인생은 얼마나 허무할까?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에 대한 비극, 그들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할 필요도 없고, 상대를 기억하려는 노력은 더욱 슬플 뿐이다. 변화가 없다는 생각과 자신의 미래가 없다는 괴로움, 영화는 그런 것들로 뒤범벅이 되고 있다. 마치 오늘의 젊은이들의 괴로움을 읽기라도 하듯.

하지만 그들 주변엔 변화가 있다. 감지하지 못할 뿐. 간나미 유이치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자연의 작은 변화도 변화인 것이며, 그런 것들 속에서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삶의 고통스런 현실 앞에서 무너지면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사랑스런 충고일 것이다. 오늘과 내일이 같다고 10년 후의 오늘이 같을 수는 없다. 모르고 지나칠 뿐, 변화는 있기 마련이며, 새로운 인생에 대한 활력을 찾길 바라는 감독의 염원은 잔인한 마지막 전투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전투기 조종사를 맞이하는 구사나기 스이토의 웃음 섞인 모습에서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는 좋든 싫든 오며, 또한 육체는 어른이 되지 않지만 성숙은 할 수밖에 없는 키르도레에게도 오는 것이다.
영화는 화려한 전쟁이 있으면서도 잔잔하다. 잔인할 만큼.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인간들의 외로움은 변화가 없는 속에서의 고통일 수는 있다. 그런 것을 허무함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다. 미래라는 시간성을 결코 고려할 수 없기에 현실에서의 작은 변화에 둔감해버리면서 현재의 생의 기쁨을 놓치고 마는 어리석음은 분명 인생의 활력을 무너뜨리며, 자신의 가치를 비하하는 슬픈 현실을 자아내게 한다. 하지만 그들 역시 변화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생명이란 주기를 볼 때는 말이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에 그냥 그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변화는 오는 것이며, 그 변화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짧지만 변한다. 인생은 힘들과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변화하는 작은 것들 속에서 현재의 가치를 찾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며, 그리고 인간의 의미있는 생활과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허무함과 자기 파괴는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된 현실에서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말라는 영화의 마지막 이야기는 묘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다. 영화 스카이 크롤러는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의 이야 기지만 변화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나치는 변화에 대한 참의미를 들려주고 또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