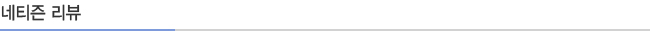|
영화를 보면서 염두에 둔 것은 장르와 영화명과 배우였다.
이 영화의 장르는 <액션>이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고 본 것이 액션의 수준이다. 원빈이 구사하는 액션은 미려하다. 흔히들 동네 양아치들이 각목들고 연장질하는 그런 류의 액션이 아니다. 액션의 동선을 최소화시키고 불필요한 액션을 생략한 그야말로 정곡만 찌르는 고급 액션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오버액션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빈의 싸움 시간이 짧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다.
다른 장면들은 기억이 나지 않아도, 스토리가 얽히고 섥혀 이해가 어렵더라도 원빈의 화장실 액션씬, 라스트 액션 씬, 그중에서도 동남아 친구와의 최후의 결투 씬만 본다면 지금까지 봐온 것들과는 격이 다르다는 생각이다. 킬빌에서의 우마써먼이 보여주는 피비린내 싸움과도 다르고 스티븐시걸이 보여주었던 골절꺾기와도 구별되는 뭔가 새롭게 경험하는 액션에 감탄할 수 밖에 없다. 다시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원빈의 액션씬 때문일 것이다.

이 영화의 제목은 <아저씨>다.
아저씨라는 이름을 잘 지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누군가 사회적 약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던지는 식의 모티브를 가졌던 영화는 많았다. 레옹이라든지 테이큰이 우선 떠오른다. 레옹이라 하면 희대의 역작이자 수작으로 잘 알려진 영화고 가장 최근에 본 테이큰은 몇 번을 봤는지도 모를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수작으로 빠른 템포와 납득할 만한 복수가 기억되는 영화다. 특히 테이큰은 철없는 자기의 딸을 구출해 내기 위한 아버지의 투신이기 때문에 공감이 갔고 영화에 빨져 들 수 있었다.
그러나 아저씨는 다르다. 그저 옆집 아저씨일 뿐이다. 왜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옆집 꼬마를 구할 수 밖에 없게 된건지 동기 설명이 부족했다. 이는 영화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고 라스트씬에서의 구출해 낸 아이와의 포옹과 원빈의 울음이 신파로 폄하되는 요인이 되었다. 좋은 영화일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다. 물론 영화이기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 하면서도 공감이 안되니 감동도 안된채 손발이 오그러졌다.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였다면, 오빠였다면... 더욱 강한 동기 부여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원빈>이다.
원빈은 <태극기 휘날리며>와 <마더>에서 경렬한 인상을 주었던 배우고 CF의 탑클라스 배우다. 같은 남자가 보더라도 최고의 미남배우다. 원빈은 얼굴부터 전신에 이르기까지 흠결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신체조건을 가졌다.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잃고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어두운 곳으로 떠밀려 지내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을 원빈은 연기했다. 그래서 놀라웠다. 그의 눈은 슬펐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원빈이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것은 적절했다. 그러나 너무 완벽한 원빈으로 영화의 몰입도가 떨어졌다. 내게만은 그랬다. 옆집 꼬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 놓았던 자가 얼굴까지 멋지니 몰입하다가도 아! 지금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거지! 하고 자각하게 만든다.
오랜만에 액션 영화다운 영화를 봤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액션씬과 원빈의 비쥬얼에 국한돼 약간은 절름발이 영화가 된 듯하다. 그래서 수작이라 부르기엔 미흡하다. 원빈의 간지작렬로 영화가 뮤직비디오나 화보를 찍는 듯 보이는 것을 적절히 안배해 준 조연 배우들의 연기-정말 양아치 새끼들인줄 알았다-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러한 어두운 면이 있는가 하는 놀라움은 이 영화의 또다른 볼거리다. 꼬마 앵벌이들이 똥싸며 묶고 있는 거처와 만화가게 주인으로 등장하는 늙은 여우의 기분 드러운 표정은 아직도 생생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