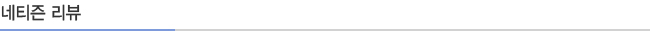|
노익장의 과시... 의외로 재밌다.. ★★★
은퇴 후 소박하면서도 조용한 삶을 꾸려가고 있는 CIA 특수요원 출신 프랭크(브루스 윌리스)는 전화로만 얘기해 본 연금 전화 상담원인 사라(메리 루이스 파커)와의 진지한 만남을 기대하는 중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암살요원에게 습격을 당한 프랭크는 사라와 함께 사건의 조사와 반격을 위해 옛 동료인 조 마테슨(모건 프리먼), 마빈 보그스(존 말코비치), 빅토리아(헬렌 미렌)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고, 일상의 삶에 지쳐가던 이들 은퇴 요원들은 힘을 모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딱히 이 영화를 보고 싶어 보게 된 건 아니었다. 시간이 얼추 맞아 떨어졌고, 출연 배우들의 면면이 호기심을 자아냈기 때문이다. 이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액션의 색깔은 과연 무엇일까? 아무래도 이미 은퇴한 노인들(?)의 활약이기 때문일까. 전체적으로 <레드>는 액션영화의 숨 막힐 듯한 스피드보다는 여유와 느긋함이 먼저 느껴지는 영화다. 물론 그렇다고 <레드>가 늘어진다거나 재미없다는 소리는 아니다. 오히려 최근 봤던 그 어떤 액션영화보다 의외로 매력적이고 풍부한 재미가 느껴지는 영화다.
재미의 원천은 우선 적절한 유머 감각에 있다. 브루스 윌리스의 활약과 유머는 언뜻 <다이 하드> 시리즈를 떠올리게 하며, 존 말코비치의 편집증적 코미디 연기는 실로 일품이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비집고 나오는 네 노인네의 유머는 액션영화에 따뜻한 질감을 불어 넣는데 성공한다. 또한 주인공들의 나이를 고려해서인지 주로 총격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액션 장면도 나름대로 볼거리를 제공한다. 현실과는 거리가 먼 과장된 장면들(바주가포를 권총을 쏴서 막아내는 장면)도 이 영화의 원작이 만화이기도 하지만, 영화 전체의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물론 이 영화는 매우 단순하며 전형적이긴 하다. 영화는 마치 미국 권력의 치부를 파헤치는 듯 다가서다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급격히 방향을 바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론에 다다른다. 다분히 80년대식 액션영화의 구조를 보는 듯하다. 80년대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음에도 구태의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도 능력일 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