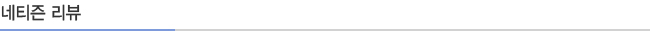|
프랑스의 영화를 정말 오랜만에 보았다.
영어권 영화나, 일본영화,한국영화 일색이던 영화중에
타인의 취향은 오랜만에 묘하게 웃게되는
조용히 공감되는 영화였다.
특별할 것 없는 프랑스의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은 가족으로, 직원으로 친구로 모두 얽히고 섥혀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취향이 없다.
자신의 선택이 항상 옳다고 느낀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감각은 수긍하지 못한다.
대머리 사장의 부인이 제일 심한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는 모두 조금씩, 자신만의 취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건 아닐까?
나도 저런적 잇었는데, 라는 공감도
저런 기분나도 알것같아. 하는 생각도
조용하게 드는 괜찮은 영화였다.
결혼을 했음에도, 자신의 영어 과외 선생이자 배우인 여자를 사랑하는 대머리 사장의
지고지순한 미련스럽게까지 한곳만 바라보는 그 사랑이
조금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아마, 단순히 육체적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플라토닉 러브여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 사랑의 표현이 자신이 수십년을 고집했을지도 모르는 콧수염을
단박에 잘라버리도록 할정도로 순수한 사랑이여서 그랬을까?
영화는 가지가지 인간의 군상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같다.
끔찍히도 경멸해 마지 않았지만,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여는 클라라(?)도
결국은 플룻을 연주해내는 운전사도,
자신의 인테리어만 고집하다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모님도,
모두 하나같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때에, 그 속에서 우리 자신도 빛을 바란다는걸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