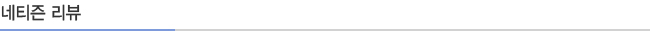|

이준익 감독의 이름만으로도 이미 이 영화는 꼭 봐야할 영화였다.
원작을 보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 줄 영화임이 틀림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사랑하는 연인도 따르던 동지들도 매몰차게 버린 이몽학.
그의 광기어린 집착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이 아닌 것에 마음 아팠다.
그를 쫓던 황처사의 추격은 먼저 죽은 친구의 '동학'의 이념을 지키기 위함이라기 보다
친구를 죽인 이몽학에 대한 복수가 더 큰 의미로 다가와서
한양을 향하는 몽학의 발걸음을 만류하는 장면에서는 '대의' 보다는 그냥 '정'으로만 느껴졌다.
오히려 '대의' '이상' 이라곤 전혀 없이
그냥 감정에 치우쳐 아버지와 황처사에 대한 복수를 꿈꾸면서
이몽학을 증오하는 견자의 마음과
새로운 세상이고 뭐고 연인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한 백지의 마음이
나에게는 더 공감하기 쉬웠던 것 같다.
또한 명분 따위는 중요치 않고
상대방과 무조건 반대의 당론만이 의미를 갖는 동인과 서인의 우기기 싸움이나
그 사이에서 대충대충 자기 자리만 챙기고 있는 나름 시크(?)한 선조의 모습이
왠지 몇백년 전의 흘러간 이야기 같지만은 않아서
웃긴데... 마음껏 웃지 못했다
|